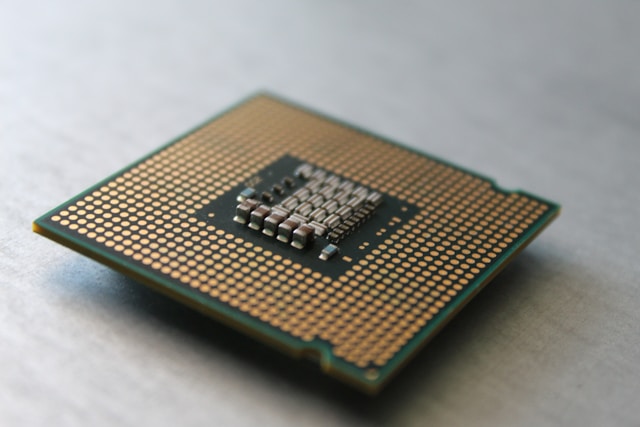|
1999~: 삼성 싱글톱 독주의 시작
1996년, 삼성이 주인공이 된 D램 시장에 또 한 번 치킨게임이 찾아옵니다. 불황 사이클이 시작된 거죠. D램은 수요와 공급 변동에 민감한 시장이에요. 수요보다 공급이 5%만 많아도 가격이 반토막 나고, 5%만 부족해도 몇 배로 뛰죠.
그런데 1996년의 불황은 그야말로 슈퍼 빙하기였습니다. 주력이던 PC용 D램 가격이 무려 10분의 1로 급락했거든요. 3년간 모든 D램 기업들이 적자에 빠지고, 감산을 하고, 심지어 일부는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오직 삼성만 예외였어요. 감산도 안 했고, 적자도 없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자체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당시 삼성전자 임형규 전 사장은 ‘제품 다양화’와 ‘엔지니어 집단의 힘’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임형규·양향자 ⟪히든 히어로스⟫, 디케, 2022)
삼성은 PC용 D램만 만든 게 아니라, 서버용, 그래픽용 D램까지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진 PC용 대신,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 정도로만 떨어진 그래픽용·서버용을 확대 생산한 거죠. 원가가 20~30% 수준이라고 했을 때, PC용은 팔면 팔수록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지만, 서버나 그래픽용은 아직 이익을 낼 수 있었어요. 당시 그런 라인업을 갖춘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삼성만 가능했을까요?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임 전 사장은 ‘가장 강력한 기술자 집단’이 그 경쟁력의 본질이라고 힘주어 말하더군요.
“후배들을 말에 비유해서 미안하긴 한데, 메모리 경쟁은 ‘500마리 말이 이끄는 전차레이스’와 비슷해요. D램 설계라는 큰 분야 아래 대여섯 개의 기둥이 되는 기술이 있고, 각 기둥기술 아래에 십여 개의 줄기 기술이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수십 개의 줄기기술 분야가 있는 겁니다. 연구개발과 설계, 제조, 후공정… 큰 분류가 있고 분류별로 세분류가 있는 식이에요. D램은 그 모두를 완벽하게 잘 해내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로 가장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승부는 그래서 ‘이 기술자 집단’의 양과 질에서 판가름나요.
결국 승부는 기술자 집단의 힘, 그로 인한 제품 다양화에서 났다고 할 수 있죠. 당시 우리 엔지니어 숫자가 경쟁사의 2배쯤 됐거든요? 엔지니어의 질도 좋았고. 또 표준화도 잘했어요. 그래서 모든 D램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D램이 20종류가 있으면, 삼성은 그 20개를 매년 모두 새로 개발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손해 보는 제품을 줄이고, 수익 나는 제품을 늘렸어요. 다른 회사들은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1996~1998년을 견뎌냅니다. 혹한이 지난 뒤인 1999년, 주위를 둘러보니 경쟁자들이 없어요. 대부분 사라진 뒤였죠. 한때 50개가 넘던 D램 기업은 이제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밖에 안 남아요.
삼성은 ‘압도적 1위’, 즉 싱글톱으로 올라서요. 사실 1993년부터 1등이었지만, 그 때는 아슬아슬한 1등이었고 1999년 부터는 아예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 뒤 20년간 1등을 지켜온 건 바로 이 치킨게임에서 승리한 결과였다고 임 전 사장은 회고해요.
2000년대 들어서 살아남은 D램사들을 살펴보죠. 우선 삼성전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 남죠. 하이닉스는 정부 주도 인수 합병을 거쳐 간신히 살아남았고, 일본은 기업들을 모아 엘피다를 만들었죠. 대만, 싱가포르의 중소 업체들은 마이크론과 합쳐졌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미국회사지만, 공장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에 걸쳐있어요.)
그러다 이후 일본의 엘피다가 결국 파산하고 말고, 드디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개 회사만 살아남은 체제가 완성됩니다. 이제 새로운 경쟁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킨게임에서 살아남은 기업에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 자리잡은 거예요.
여기까지 D램 시장의 상황이고요, 이제 시스템 침 시장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1981~2007: ‘모든 길은 인텔로 통한다’
인텔은 CPU의 절대지존이지만, 재밌는 것은 이렇게 될 줄을 처음에는 인텔 자신도 몰랐단 점이에요. 사실 인텔은 CPU가 아닌 D램 회사였어요. (일본에 패해서 D램을 포기하기 전까지는요.)
1971년, 인텔은 ‘Intel 4004’라는 칩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사실 일본 계산기 회사 비지콤이 차세대 계산기에 들어갈 칩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주문한 물건이었고, 처음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몰랐어요. 심지어 처음엔 이 칩의 설계와 소유권을 비지콤에 다 줘버렸을 정도였죠. 그러다 뒤늦게 이걸 다른 회사에 팔 수 있겠다는 사실을 깨닫고 라이선스와 판매 권리를 되사들여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1년, 드디어 IBM이 퍼스널컴퓨터 PC 를 내놔요. 바햐흐로 PC 시대가 열린 것인데, 여기에 인텔의 8088 프로세서가 채택되죠. 인텔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 때도 인텔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크리스텐슨의 ⟪혁신기업의 딜레마⟫를 펼쳐보죠.
“70년대 이후 서서히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무게추가 넘어왔다. 인텔에 전략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단순히 D램은 안됐지만, CPU는 잘 팔렸다.
심지어 인텔은 8088 제품으로 큰 성공을 한 뒤에도 몰랐다. 차세대 생산량이 가장 많을 품목 50개를 꼽았는데, 여기에 PC를 넣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인텔의 CPU 장악은 알고 한 성공이 아니다.” p236
알고 한 성공이든 얼떨결에 이룬 성공이든, 인텔은 8088 이후 성공가도를 달려요. 특히 90년대 이후 펜티엄 시리즈가 성공하고, 윈도우 운영체제와 결합하고, 데이터센터와 서버 시장에 진출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비결은 간단합니다. 가장 빠른 칩을 매년 새로 내놓았어요. 무어의 법칙에 따라, 다른 누구보다 작고 빠른 칩을 계속해서 내놓았어요.
그러자 컴퓨팅 파워를 원하는 기업과 개인은 누구든 새로운 인텔 CPU를 최우선으로 찾게 됐어요. 디자인을 하든, 일반 사무를 하든, 게임을 하든 모든 길은 인텔로 통했어요. 무어의 법칙이 보장하는 가장 빠른 칩을 늘 제일 먼저 개발하니 ‘모든 욕망’이 인텔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호환성 이슈가 있긴 했어요. 다들 인텔 칩을 쓰는데 조금 싸다고 AMD의 CPU 칩을 쓰려니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AMD가 90년대 내내 고전을 합니다.)
|